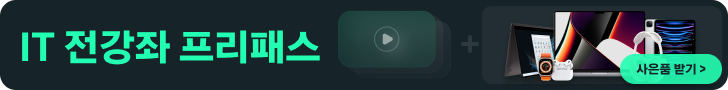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다르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고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에 맞춰 기술을 개발, 적용하는 것을 일컬어 ‘적정기술’이라고 한다.
적정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구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이라도 그것의 비용을 최소화하면 그것 또한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적정기술의 기본적인 전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그 기술 적용 국가의 생활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적정기술에서 배제되며, 주로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
많은 분들이 기술원조와 적정기술 상품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 적정기술 상품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기술원조는 기부에 가깝다. 때문에 적정기술 상품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생산하는 개인업체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참신한 적정기술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한다. 우리에게 전등은 너무 당연하다. 어두운 밤 집에 들어와 스위치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온 방안이 환해진다.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현대인들에게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수의 세계 인구는 이 전기를 이처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호롱 불에 의지하거나, 그것조차 안되는 이들은 그냥 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등이 없으니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으니 계속 격차는 벌어진다.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힘들다.
등유로 호롱 불을 켜고 생활하는 지역은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등유는 전기보다 비싸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다. 게다가 호롱 불은 전기처럼 환하지도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회로, 그것을 통해 저개발국가에는 희망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다. 바로 미국의 ‘노케로(Nokero)’사이다.
노케로라는 이름은 “No Kerosene”의 줄임말이다. 뜻은 “등유를 사용하지 말자”. 이 회사는 태양광 전구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전기와 등유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전구 말이다. 이름의 어원처럼 적정기술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회사이다.
노케로사의 전구는 태양전지가 내장된 LED램프다. 최장 4시간까지 빛을 밝힐 수 있으며, 최대 5~10만 시간 사용할 수 있고, 패널도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저감효과와 엄청난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전구를 태양에너지로 충전시킨다. 빨래를 말리듯 밖에 내놓으면 충전된다. 낮에 충전하고 밤에 쓰면 된다. 또 흐린 날에도 충전이 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자동 절전 기능으로 일정 LUX 이상일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에너지 낭비를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효율적인 제품이다.
이 전구의 가격은 개당 15달러로, 주로 기부 프로그램인 ‘Buy one Give one’을 통해 확산 중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이 전구가 비단 저개발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도 판매량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는데, 주로 캠핑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한다. 또 자연재해로 전기가 끊어진 지역에 빛을 보급하기 위해서도 구매한다.
재미있는 경우이다. 적정기술 상품이 저개발국가 말고도 선진국에서 수요를 불러일으키다니. 창업자는 이미 예측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패배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윈-윈 했다. 비단 전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적정기술의 활용으로 수익성과 희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노케로의 대변인인 톰 보이드(Tom Boyd) 이사는 “문명의 이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이들을 위해 우리의 적정기술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