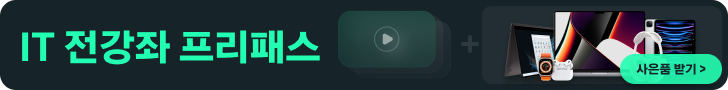인간실격과 데미안. 선과 악,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다. 다자이 오사무, 헤르만 헤세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삶을 회의하고 질문을 성찰하는 두 주인공을 내세운다. ‘인간실격’의 요조는 다자이 오사무가 자신을 투영한 자전적인 인물이다. 책에서 요조는 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묻는다. 한번 생각해보자. 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죄는 위법을 말한다. 따라서 죄의 반대말은 선이 아닌, ‘기준에 부합함’이다.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조가 자신의 삶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꼈던 것은 보편적 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이었던 것이다. 요조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적응하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다. 그는 도저히 인간의 사회에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요조가 선택한 마지막 인간에 대한 호의는 바로 ‘익살’이었다. 그는 익살을 연기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사회의 변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들은 괴로운 것 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을 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조는 비틀거리며 홀로 서보려 애쓰지만, 방황하던 미약한 그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 역시 이 소설을 쓰고 한달 후 자살한다. 책에서 요조는 끊임없이 인간과 세계의 추악함, 자신 내면의 추악한 모습을 말한다. 진정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그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이중적인 모습을 혐오한다. 하지만 나는 다자이 오사무와 요조가 세상과 인간을 혐오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인간을 사랑한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과 인간은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고 진득한 무언가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어울릴 수 없고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인간은 사람 인(人) 사이 간(間) 자를 쓴다. 옛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인간실격’ 사람이 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사회에도 낄 수 없었던 무력한 생이 참 비극적이라고 느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 한 거짓말로 인해 자신은 영원히 착한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며 괴로워한다. 이후에도 질투, 나태, 반항심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자신은 영원히 선한 인간이 될 수 없는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 어느 날 싱클레어의 앞에 나타난 데미안은 ‘선과 악은 하나이며 뗄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약하고 악한 면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데미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하고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가자는 메시지를 던진다면 ‘인간실격’은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고 있던 어둠을 마주보게 한다. 상당한 독자들이 인간실격을 읽으며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인간실격’의 인간인 요조의 독백에서 느껴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동질감과 공감, ‘이건 당신이야,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야’ 라고 말하는 듯한 소설에서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데미안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타파하며, 살아가는 일은 그 모두를 껴안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준에 중심을 세운다. 그러나 요조는 자신의 삶 자체를 죄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택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인간실격이 쓰인 60년 전에도, 현재도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은 선과 악 두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에 기반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인간으로서 한단계 나아가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
인간실격과 데미안. 선과 악,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다. 다자이 오사무, 헤르만 헤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