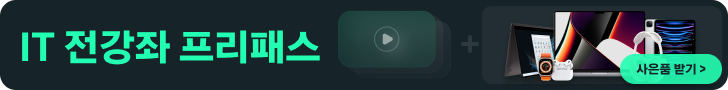서울대가 낳은 이상문학상 제1회, 제2회 수상자 -김승옥과 이청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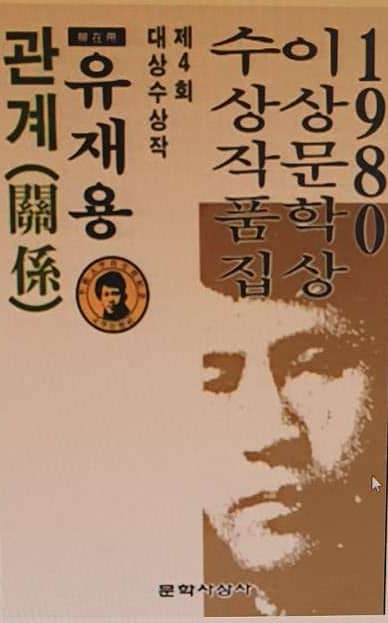
이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교과서에 강한 인상을 남긴 작가이다. 그는 생전에 미술가이기도 했고, 건축가이기도 했으며, 또한 시인 겸 소설가를 한 인물이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오시오?”로 시작하는 그의 소설 ‘날개’의 첫 문장은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인지 못할 충격을 주는 구절이다. 그런 이상의 문학적 존재감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77년 월간 《문학사상》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이상문학상’이라는 문학상마저 제정한다.
현재 이상문학상은 소설가 김동인의 이름을 딴 동인문학상과 현대문학상과 더불어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소설가들에게는 꿈만 같은 상이다. 그렇기에 기라성 같은 소설가들이 수상자 명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 개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 처음 수상자를 정해야 했던 제1회 수상자일 것이다. 과연 어떤 누군가가 ‘이상’이라는 거대한 팻말이 달린 문학상을 목에 걸 것인가? 그건 당시 시대에서 초유의 관심사였다.
이문열, 박완서, 최인호 같은 작가들이 막 등단을 하거나 이제야 겨우 문단에 이름을 알릴 시절, 문단에서는 두 젊은 피가 용암을 분출하듯 활발한 창작을 하고 있었다. 바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불어불문학과) 김승옥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독어독문학과) 이청준이었다. 둘은 같은 서울대학교 60학번으로 같은 학부를 다니고 있었다. 1962년 ‘생명연습’으로 등단한 김승옥과 1965년 ‘퇴원’으로 등단한 이청준은 우스갯소리로 불문과에는 김승옥이 있고, 독문과에는 이청준이 있다는 밈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두 작가는 대학시절에 친분이 있었고, 이청준이 문단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김승옥 작가의 ‘꼬드김’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4.19 세대라고 불리며 김승옥과 이청준, 최인훈 등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상문학상의 제 1회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두 사람보다 더 목을 매었다.
당시 두 사람은 의도치 않았겠지만,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이었다. 소설을 쓰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적으로 서술하는 묘사 방식의 유형이 있고, 그에 반대로 서술자가 어떤 사건의 전개과정을 개연성 있게 전달하는 서사 방식의 유형이 있다. 일례를 들어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가 그렇다. 민음사에서 출판된 레미제라블의 번역본의 쪽수만 봐도 2,556쪽이나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는 주변의 배경부터 등장인물의 차림새나 음식 따위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불문학을 전공한 김승옥의 소설은 그러한 불문학 특유의 서사가 도드라졌다. 영화 ‘도가니’로 유명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의 배경은 ‘무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김승옥 작가의 불후의 명작인 ‘무진기행’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실제로 무진기행을 오마쥬할 의도로 작명한 것으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 만큼 무진기행에 드러난 김승옥의 묘사는 안개처럼 짙은 인상을 남기고 간 것이다.
반대로 이청준은 독문학을 전공했기에 독문학의 색체가 매우 짙었다. 주어와 목적어,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그의 소설의 경우는 관념과 서사를 중요시하는 독문학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흑과 백의 모습 같이 서사와 묘사로 양분된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열광했고, 이미 문단에서 등단한지 10년이 넘은 두 사람의 작품 중 하나가 제1회 이상문학상의 수상작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었다.
결과적으로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이 제 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그 다음해 고스란히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가 수상을 하면서 서울대가 낳은 두 천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된다. 김승옥은 ‘서울의 달빛 0장’을 마지막으로 소설과 절필을 하게 되고, 이청준은 2008년 죽을 때까지 소설을 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끝까지 아이러니컬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둘을 보면서 역설된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하나의 김승옥은 별똥별 같이 반짝이며 타오른 채로 사라졌고, 이청준은 별자리처럼 꾸준하게 문학의 길을 이어갔다. 삶의 매순간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게 결국은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서울대가 낳은 이상문학상 제1회, 제2회 수상자 -김승옥과 이청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