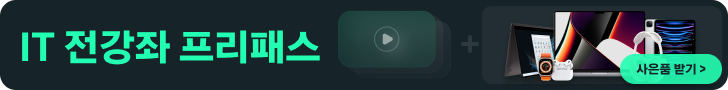최근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실적 저조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일본의 소니가 떠오른다. 한때 세계 1위 전자회사로 군림하던 소니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한국도 이제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의 물가는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느껴졌다. 그만큼 경제적 격차가 컸던 시기였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물가가 싸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도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일본은 이 노벨상을 20명이나 넘게 수상했다. 우리보다 10배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는 일본의 기초과학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두 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것도 문학과 평화상으로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적 침체기를 보냈음에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일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일본의 큰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이제 막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과연 일본처럼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 노벨상수가 10배가 차이나니 경제 침체도 10배 안좋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긴장감이다.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수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초과학에 대한 오랜 기간의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이 있다. 한국도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과학 및 기초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구조의 변화, 노인 복지 정책 강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반도체와 같은 기존 강점 분야 외에도 AI, 바이오테크, 그린 에너지 등의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