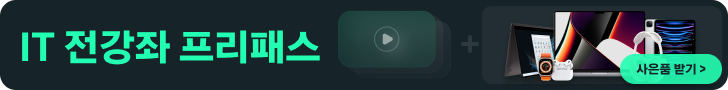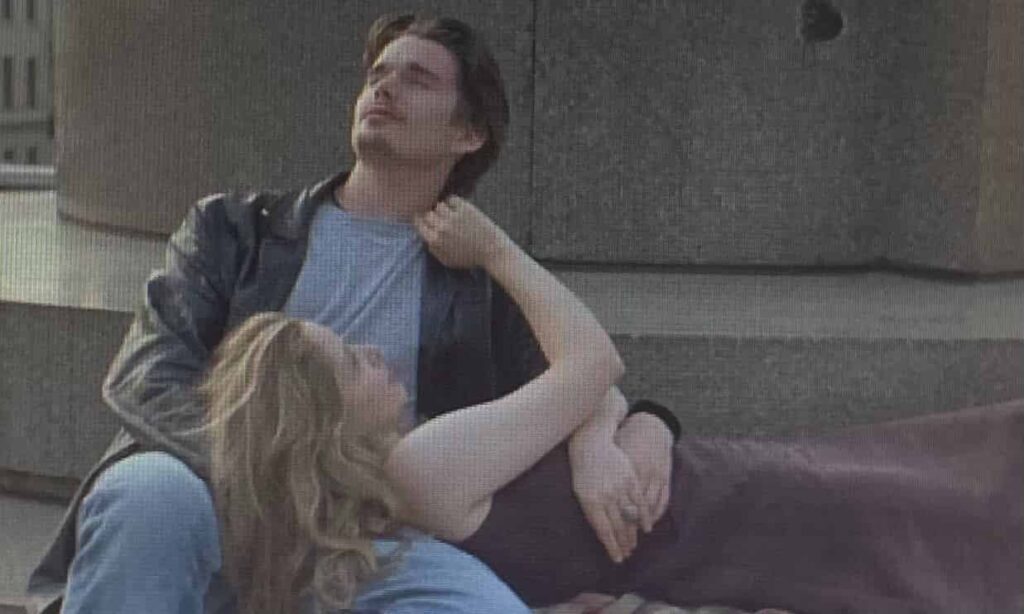
단 하루,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비포 선라이즈(Before Sunrise, 1995)>
영화는 기차 안에서 시작된다.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생인 ‘셀린느(줄리 델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고, 가을 학기 개강에 맞춰 파리로 돌아가는 중이다. 셀린느는 옆자리의 독일인 부부가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피해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때 ‘제시(에단 호크)’라는 미국인 청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각자 유년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잘 통했다.
제시는 셀린느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녀와의 헤어짐이 아쉬워 함께 비엔나에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셀린느도 아쉬웠는지 제안을 수락한다. 그들은 정처없이 비엔나 거리를 떠돌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간다. 레코드숍, 카페테리아, 다뉴브강의 선상 레스토랑 등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 사람들 치고는 꽤 평범한 데이트를 이어나간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아침이 되어 6개월 뒤 이곳에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그들은 헤어지게 된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보통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야’ 혹은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된 것은 영화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들이 했던 데이트나 대화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야’. 낯선 여행지에서 대화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느낌은 있지만 여느 로맨스 영화처럼 뜬금없는 타이밍에 로맨틱한 눈빛을 주고 받는다거나 결혼해달라며 생뚱맞게 다이아몬드 프로포즈를 하지는 않는다. 서로가 낯선 그들은 자신의 유년기, 인생관, 사랑관, 가치관, 정신세계 등 다소 심오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는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 제일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1995년에 개봉한 이 오래된 로맨스 영화에 왜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 나는 철저하게 관찰자가 되어서 그들의 하루를 따라다녔다. 문득 현실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해졌다. 이들이 하루가 지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 했다.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까지 주절주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에는 미련과 그리움이 묻어 나왔다. 현실적인 그들의 대화에 나는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걸까. 그들의 마지막을 모습을 보자니 내 마음까지도 싱숭생숭했다. 적절한 영화적 요소가 가미된 현실적인 남녀의 대화가 매우 매력적이었던 영화였다. ‘로맨스 영화의 엔딩은 거기서 거기지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나에게 ‘이 둘은 과연 6개월 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생기게 했다. 9년에 한 편씩 발표된 일명 ‘비포 시리즈’ <비포 선라이즈>(1995), <비포 선셋>(2004), <비포 미드나잇>(2013)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단 하루,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비포 선라이즈(Before Sunrise, 1995)> 끝.